요즈음 사찰음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 같다. 사찰음식이란 본래 무소유한 수행자의 음식이니 검박하기만 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워낙 외화내빈(外華內貧)하고 물질과잉(物質過剩)의 시대를 사는 데 지친 사람들에게 건강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큰 숲같은 전통 속에 담긴
사찰음식 흔적 찬찬히 음미
조리법 너머 그것에 깃든
그윽한 자취들 들어낼 것
한편으로는 대중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현재의 사찰음식이 정말 사찰음식이냐는 물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 속에는 사찰음식에 대한 부정보다는 탈속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찰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세속화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애정 어린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불과 20~30년 전만해도 낯선 음식이고 미지의 음식이기만 했던 사찰음식이 지금은 신문이나 방송,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직접 배울 수도 있으니 사찰음식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 갈수록 사찰음식의 원형과 본래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중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그동안 사찰음식은 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주력해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음식 만들기’, 즉 조리법을 알리는 일은 음식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므로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사찰음식이 지닌 본래의 가치와 다양성을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교는 공간적으로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4개의 바다를 거쳐서 이 땅에 이르렀고,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의 세월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다. 이러한 불교의 시·공간적 전개 속에서 탄생하였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식문화 속에서 성장한 것이 사찰음식이기에 단순히 조리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이해를 얻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찰음식을 잘 알기 위해서는 커다한 숲과도 같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 속에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는 사찰음식의 흔적들을 찬찬히 더듬어 보는 일이 필요한데 고조리서(古調理書)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선인들의 글밭과 사람과 사람을 거쳐 전해져 온 우리의 풍속에 깃들여진 사찰음식의 이야기들을 조각 모으듯 모아보고자 한다. 즉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닌 문화로 맛보는 사찰음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연화게 패엽경은 불이문의 천둥소리요(蓮花偈貝葉經不二門中天籟), 향적반 이포찬은 무량겁 전 땅의 밑거름이네(香積飯伊蒲饌無量劫前地肥)”
수원 화성에 있는 용주사의 주련 중 하나에 적혀 있는 글귀이다. ‘부모은중경’의 다라니를 입춘방으로 쓸 정도로 효성과 불심이 깊었던 정조임금이 비운에 간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고자 대신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수원 화성에 ‘융릉’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중창불사가 마무리 될 즈음 정조임금은 당시 박학다식하고 학문의 경지가 출중해 지극히 아끼던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를 시켜 일일이 용주사 당우 기둥마다 주련을 짓게 하였다. 그 중 천보루에 있는 주련 글귀인데 부처님의 진리를 음식에 비유하여 찬탄한 명문이 아닐 수 없다. 500여년간 이어진 숭유억불의 엄혹한 시절에도 피어난 진리의 향기 속에 깃든 사찰음식의 그윽한 자취를 문향(聞香)해본다.
김유신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발우공양 총괄부장 yskemaro@templestay.com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후원 :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더 보기
더 보기
| No. |
제목 |
보기 |
|
1 |
연재를 시작하며 |
-
|
|
|
|
2 |
납팔죽과 오신반 |

|
|
|
|
3 |
설날 사찰음식 |

|
|
|
|
4 |
정월대보름과 사찰음식 |

|
|
|
|
5 |
국수이야기 |

|
|
|
|
6 |
2월 연등풍속과 장(醬) |

|
|
|
|
7 |
삼짇날, 한식과 조왕이야기 |

|
|
|
|
8 |
두부이야기 |

|
|
|
|
9 |
사찰음식이야기 |

|
|
|
|
10 |
단오와 사찰음식 이야기 |

|
|
|
|
11 |
만두 이야기 |

|
|
|
|
12 |
유월유두이야기 |

|
|
|
|
13 |
사찰음식 또 다른 이름 향적(香積) |

|
|
|
|
14 |
백중과 사찰음식 |

|
|
|
|
15 |
슬로푸드와 사찰음식 |

|
|
|
|
16 |
추석과 사찰음식 |

|
|
|
|
17 |
사찰음식과 채식 |

|
|
|
|
18 |
재의식과 사찰음식 |

|
|
|
|
19 |
콩과 사찰음식 |

|
|
|
|
20 |
파리의 사찰음식 |

|
|
|
|
21 |
안거와 미슐랭 가이드 |

|
|
|
|
22 |
사찰음식의 또 다른 이름, 공양 |

|
|
|
|
23 |
동지와 사찰음식 |

|
|
|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통합검색
통합검색









 연재를 시작하며
연재를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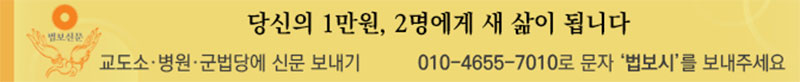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담당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담당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